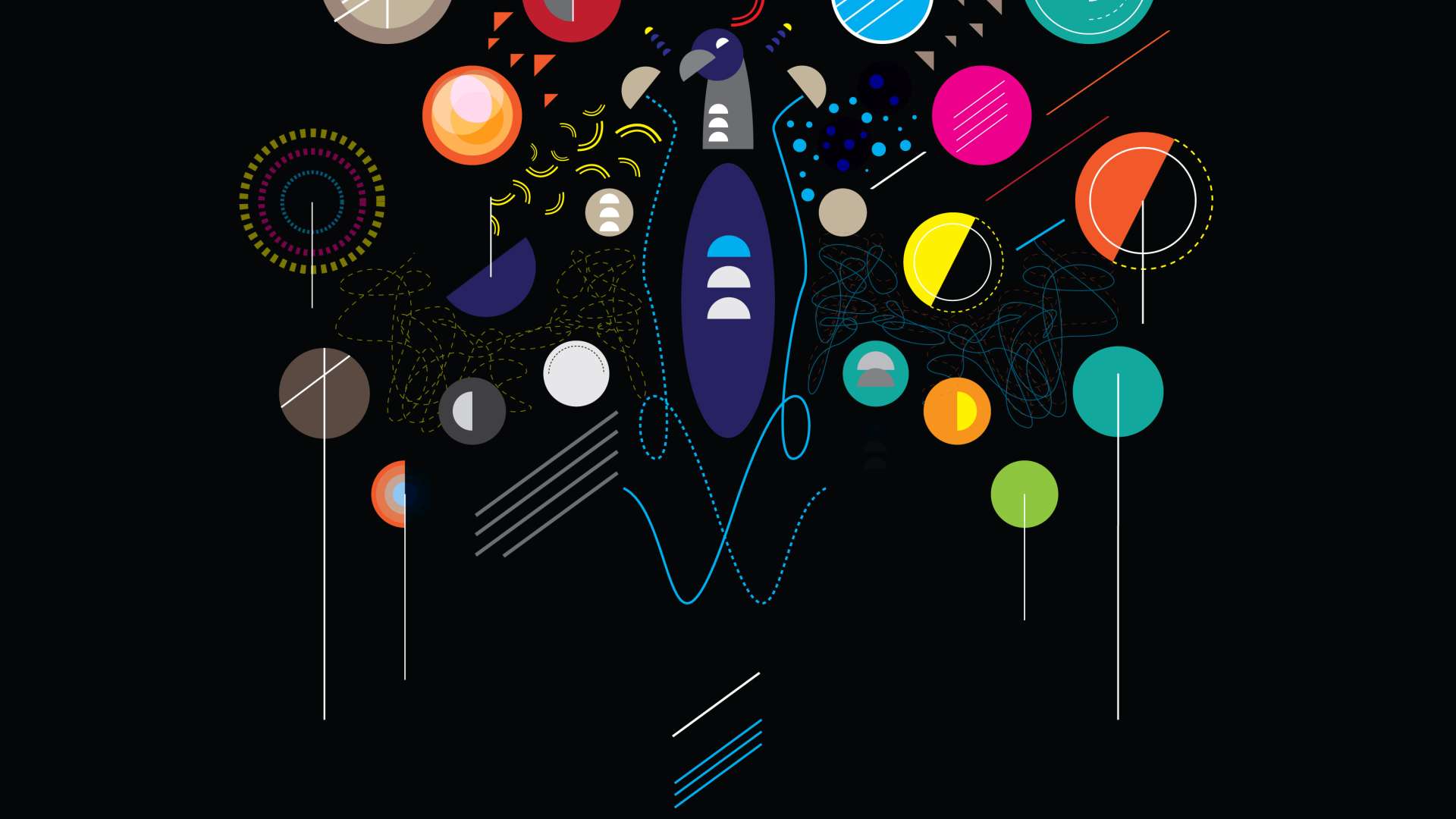- 우리의 마음은 타자에게 반응한다.
- 우리의 경험은 몸에 귀속되어 있으며, 순수하지 않다.
여는 글
유교의 사서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마음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다.
心不在焉 視而不見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에서의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는 무문관을 살펴보면
바람 때문에 사찰의 기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를 두고 두 승려가 논쟁을 벌였다. 한 승려는 깃발이 펄럭인다고 하고, 다른 승려는 바람이 펄럭인다고 했다. 둘의 논쟁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자 육조 혜능이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펄럭이고 있을 뿐이다.” 두 승려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여기서의 마음과 대학에서 말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일까? 같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수인의 전습록을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다.
어떤 제자가 바위틈에 자라고 있는 꼿을 가리키며 물었다. “세상에는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 꽃은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 저절로 지곤 하니 그것이 내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선생이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기 전에 이 꽃은 그대의 마음과 함께 고요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대가 와서 이 꽃을 보는 순간 이 꽃의 모습은 일시에 분명해진 것이네. 이로부터 이 꽃이 그대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
이제 서양으로 떠나볼까? 현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 현상학을 만들어낸 후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는 이 지향성(Intentionalität, Interntionality)들을 제시하면서 이것들에 관해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지향성들이 없이는 객관들과 세계는 우리에게 대해 현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객관들은 의미와 존재양상을 지닌 채로만 우리에 대해 존재하며, 이러한 의미와 존재양상에 있어서 객관들은 항상 주관적 작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해 있는 것이다.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ale>
후설은 마음의 지향성은 어니 경우에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탐구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문구이다. 하지만 제자인 하이데거가 이 담론을 반박하지만 더 세련되게 만든다.
하이데거
마음은 타자에게만 반응한다.
타자라는 정의는 내 삶의 규칙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타자에게 마음이 쏠린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편한데, 다음 문구가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글이다.
(우리는) 가까이 손안에 있는 존재자를 ‘배려함’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만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 도구는 파손된 것으로 판명되고 재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다. 도구는 여기에서도 어쨌거나 손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다. … 이런 사용 불가능성의 발견에서 도구는 마침내 우리’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
존재는 ‘탈은폐하는 건너옴’으로서 스스로를 내보인다. 존재자로서 존재자 자체는 ‘비은폐성 속으로(다가와 그 안에서) 스스로를 간직하는 도래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메를로-퐁티
우리는 몸에 갇혀있는 존재이다.
심장이 유기체 안에 있는 것처럼 고유한 신체는 세계 안에 있다. 그것은 시각적 광경을 살아 있게 계속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한다. 내가 나의 아파트를 걸어 다닐 때, 그 아파트가 나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제각가 여기서 또는 저기서 보인 아파트를 표상한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나 자신의 운동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나의 신체를 그 운동의 단계들을 통해서 동일한 것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국면들은 동일한 사물의 다양한 측면들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그 아파트를 생각으로 훑어볼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종이 위에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해도 나는 신체적 경험의 매개가 없다면 대상의 통일성을 파악할 수 없다.
<지각의 현상학, Phénoménologie de la percation>
지각된 광경은 순수 존재를 갖지 않는다. 내가 보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되는 광경은 개인적인 나의 역사의 한 계기이다. 또한 감각은 재구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전에 구성된 것들의 침전을 전제하고, 감각하는 주체로서 나는 자연적인 능력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나는 헤겔의 말처럼 ‘존재 속의 구멍’이 아니라, 만들어졌지만 파괴될 수도 있는 함몰이자 주름이다.
<지각의 현상학, Phénoménologie de la percation>
출처:「철학 VS 철학」 강신주